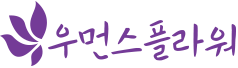성평등. 당연한 단어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광고다. 앞선 TV CF에서는 여성 CEO의 활약을 부각하더라도 다음 광고에서는 V라인 등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거나 ‘얼평’(얼굴 평가)을 하기 일쑤다. 어머니상 같은 것은 어떤가. 몇십 년째 현모양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 모든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의 ‘액션’이 답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요즘 성상품화와 성역할 편견 고착화, 성차별적 요소 등의 문제점이 쏟아지는 곳은 유튜브다. 세계 최대 동영상 포털이라는 점도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고 본사가 외국에 있어 국내의 자율심의나 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되기가 어렵다.
서울YWCA가 ‘그 광고가 왜 성차별적이냐’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 이유다. 우먼스플라워는 18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경희 서울YWCA 간사,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ㆍ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박정화 인디CF 대표, 유유니게 디자이너,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 간사는 지난 3~10월 TV와 유튜브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TV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성차별적 요소나 여성혐오, 성적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광고는 여전하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채널을 넘길 수 있는 TV와 달리, 유튜브는 일정시간 동안 광고를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클 수 있다.
황 간사팀이 분석한 결과, TV광고와 홈쇼핑에서는 성차별적 광고 사례가 총 66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젠더 고정관념 조장이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와 성적대상화가 그 뒤를 이었다.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성차별적 요소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의 역할을 육아로 한정하는 듯한 광고, 야식은 무조건 부인이 해줘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는 방송 등이 그 예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광고는 주로 남성이 주인공이고, 보조적이거나 소비자로 나오는 역할은 주로 여성이 맡는 것 역시 성차별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여성도 권위있는 주인공이나 CEO 역할로 출연할 수 있고, 남성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2019년 대한민국 등 전 세계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다.
김수아 교수는 광고와 여성 재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내 광고시장에서 성역할이 고정관념처럼 내려오는 이유를 광고주의 의지 때문으로 봤다. 광고주나 제작자 입장에서 여성에게 강인함이나 의지력 등 남성성을 갖게 하는 것이 남자에게 부드러움이나 친절함 등의 여성성을 갖게 하는 것보다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편견이 작용한 탓(최은섭 선생 연구 ‘TV광고에 나타난 양성적 성역할 분석’ 인용)이라고 한다. 또 인터넷 광고에서는 성적 대상화가 두드러지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그 대안이 ‘펨버타이징(Femvertising)’이다. 페미니즘과 애드버타이징(광고)을 합성한 단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포스트 페미니즘의 임파워먼트(동기부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광고 제작 경향이다.
편도준 실장은 현실 광고 업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규제하는 심의시스템상의 한계점과 제언을 말했다. 편 실장은 “유튜브, 인터넷용 광고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차별적 표현을 제작하고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성차별적인 표현을 넣은 인터넷용 광고를 따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